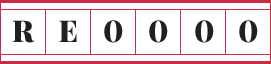"힘들지 않으신가요?"
"난 이런, 반응들이 궁금해서 … 계속 글을 쓰는 건데, 마루베 씨?"
마우스 휠이 돌아가고 스크롤도 아래로 내려간다. 창백한 빛의 화면에 눈을 잠시 깜박이고 마루베 유사쿠는 잠시 침묵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글을 쓰는 이들은 자신의 창작물이 평가받거나 침범당하는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곤 했다. 미디어 믹스, 라고 하면 말하기에는 좋았으나 원작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연출과 의도를 벗어나는 것들을 못 견뎌 슬픔에 빠졌다. 근현대의 문인이라고 하면 인정받은 작가도 그렇지 못한 작가도 평론으로 인해 낙심해 재미있는 야사를 만들어낸 것이 부지기수.
편집자라는 직업은 하는 일이 정착된 지 아주 오래지는 않았으나, 작가와 독자의 거리감이 가까운 때에도 먼 때에도 그러한 평가를 한 번 걸러서 전달하는, 이른바 멘탈 케어적인 부분 또한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작가가 스스로 찾아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독자 반응을 편집부나 마케팅 쪽보다 잘 알 정도로 찾아내 읽는 건 어떨까 싶었다. 뭔가 다른 검색 엔진이라도 가지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반응이 빨랐으므로 마루베는 여우에라도 홀린 기분으로 이치지쿠가 정리한 리뷰 모음집을 들춰봤다.
"결론은 꽤 비슷비슷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서로 달라서 재미있지, 이런 건. 인터넷이니까, 익명이라서 실제로 말할 때보다 조금 더 솔직하거나 포장되어 있거나 하고. 어쨌든 실제 사람보다도 알기 쉽다는 건 신기해. 굳이 이렇게 쓴다는 건 아무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니까, 생각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때보다 말 같은 게 많아지게 되거든요."
" … 그렇군요?"
"마루베씨랑은 관계없는 이야기긴 하지~."
"일단은 예전 잡지 투고가 왕성할 때부터 일했어서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글만으로는 알기 어렵지 않나 … ."
작가님도 그렇죠 … 라는, 말하지 않은 뒷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하고 이치지쿠는 기지개를 폈다. 마루베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연다.
"오늘은 뭔가 조용하시네요."
"비교적 상냥해져보기로 해서요."
" … 갑자기 전보다 더 소란스러워지지는 않으시겠죠? 구급차는 정말로 그만 부르고 싶습니다."
이치지쿠는 대답없이 가볍게 웃었다. 그건 뭐 대응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른 일이니까. 뒤따른 말이 없는 것이 못내 불안한지 한참을 바라보던 마루베가 한숨을 내쉬면서 떠나는 소리가 귀 끝에 걸린다. 그런 중에도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리뷰를 살펴보던 이치지쿠는 문득 익숙한 이름의 블로그를 찾아낸다. 아, 쿄이케. 보아하니 잠깐 찾아보지 않은 새에 이 남자는 정말로 이 책을 읽고 리뷰까지 착실하게 쓴 모양이었다. 뒤늦은 댓글로 인해 볼 수 있는 반응도 나름대로 재미있었으므로 이치지쿠는 가볍게 웃으면서 창을 닫았다.
세상에 절대적인 건 있을까? 기준인 사람이 저마다 제각각인데.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 공감할 거리는 있을 수밖에. 그런데 그걸 찾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찾을 의지가 있는지는 참. 너희는 매정하다니까. 이치지쿠가 화면을 손톱 끝으로 가볍게 두드린다. 평범함을 기준으로 만든 듯한 사람이 화면 너머에 있다.
그러나 평범함은 무엇인가. 가장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건 평균 외를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니까. 좋다 나쁘다 이전에 그럴 필요가 없지. 왜 독이 독인지 알아야 하나? 독이니까 피하고 치우면 된다. 독이 뭔지 굳이 알려는 것은 사실 자연에서는 잘못된 일이라니까, 학습하고 멀리하는 게 가장 적절한 대처야. 그 점에서 봐, 아웃사이더로 밀린 것들은 선별에서 밀려나 '매정하다'는 거지. 뭐 문명이 좀 발달한 인간들은 그래도 딱히 상관없다고 할까, 이성이나 사랑 평등을 최고 가치로 말하는 만큼 본능에서 벗어난 행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약간의 애정 섞인 장난들이다만.
신기하게도 당신들은 사랑은 자기애의 연장선이라 밝혀냈음에도 타자화될 때에야 전혀 다른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미디어 만만세다.
그러면 이 감상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을 얹을까, 말까, 이치지쿠는 짧은 고민을 하며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열었다. 뭐, 이건 대면하고 말하는 쪽이 여러가지 보거나 들을 수 있겠다. 영화 감상문도 궁금하고. 곧 개봉이라고 했지. 그러므로 평소처럼 조금 쓸데없으면서 자신만 아는 내용의 메일, 송신. 창백한 손가락이 버튼을 누른다. '개미 눌러본 적 있어, 쥰 씨?'
마리아 | 2012년 1월
즉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네요!
하나쥰씨 감상문 로그에 대한 짧은 반응로그 같은 거
즐거웠습니더 #놀아줘서감사해요
"버리는 건가요?"
이치지쿠는 한가롭게 고개를 든다. 뭐라고? 마감에 질려 오사카까지 도망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듣게 된 야츠모에게 며칠 뒤쯤 '이제 일 해야지' 하고 덜렁 들려온 날이었다. 편집자의 물음에 이치지쿠가 원고지를 발끝으로 민다.
"그럼 이걸 쓰려고 바닥에 뒀을까 봐?"
"20권은 나올 것 같은 분량인데···."
"쓰레기를 얼마나 내도 의미가 없지."
이치지쿠는 종이를 밀어 쌓여 있던 것마저 무너뜨리고 소리내 웃는다. 이거 말야, 도미노 같네!
"어릴 때 적은 것들이야. 어린 아이의 사고는 너무 잘 튀어서 어려우니까 커닝 페이퍼 용이지."
"하아……."
일기? 되물음에 이치지쿠는 빙긋이 웃으며 생각한다. 비슷하지. 관찰 일기, 대체 저건 뭐 때문에 저런 형상으로 일그러진 거고 저게 무슨 감정인지…. 이 문장은 말하지 않았다. 웃는 얼굴을 화내는 얼굴로 받아들이는 어린 아이는 다소 적응이 어려웠을 법 하다. 종이에는 물음표가 가득하다. 마루베는 한 장을 집어들고 읽어보다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역시 소설인가요' 라고 물었다.
"그렇게 보이면 소설인 거야."
"너무 맡기는 태도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상대가 믿지 않으면 거짓인 시대가 아닌가. 바벨탑이 애잔해할 거라고, 마루베 씨."
그건 당신이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때가 아닌가.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은 책망을 이치지쿠는 어깨를 으쓱하고 스스로 짚었다.
"하기야 내가 일부러 못 믿게 만들 때도 있지만."
"50주년 행사에는 참석해 주시죠."
"그럼 그때까지 살아있게 물 뜨고 기도해 줘, 마루베 씨도."
생물의 틀이 잘못된 모양이라, 빨리 죽는 쪽이 좋지 않을까요? 도마뱀이 보는 사람 얼굴도 별로 좋지는 않겠지요-….
어린 필체가 진지하게 내일을 대비해 적은 글을 눈으로 읽고 이치지쿠가 코웃음을 친다. 옛날의 본인도 수명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는 편이 저에게나 세상에게나 이롭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였을까요?
잘 기억이 안나서 여기서 컷
'LOG'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흑해 관계타로 : 와이걸어쩌죠선생님? (0) | 2024.09.03 |
|---|---|
| 천삼지-승- (0) | 2024.08.05 |
| 1월 마지막의 오필리어 (0) | 2024.01.22 |
| 코코포리아 pl 하는법 초간단 (0) | 2024.01.14 |
| 1월 신인 대상 문학상 코멘트「당신은 행복을 알고 있습니까?」 (0) | 2024.01.13 |